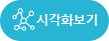| 항목 ID | GC06201225 |
|---|---|
| 한자 | 平常服 |
| 영어공식명칭 | Everyday Clothes |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집필자 | 성윤석 |
경상남도 함안 지역에서 일상생활이나 작업할 때 입는 의복.
함안 지역에서 평상시 사람들이 즐겨 착용하던 의복이 일제 강점기를 기점으로 한복에서 양복으로 변해 가고,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한국 사회의 문화 변동 속에서 평상복의 지역성이 전국적으로 같아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1930년대~1940년대에 이르면 계층 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신분에 의한 의복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한복뿐만 아니라 서구적인 차림으로 의복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즉 양복과 전통 한복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양복이 정착되고 한복 착용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반짝이', '지지미[쫄쫄이]', '다후다[태피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를 의복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인견'으로 제작한 의복이 인지도가 높았다.
1960년대~1970년대에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합성 섬유가 의복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양복을 일반적인 평상복으로 즐겨 입었다. 1980년대~1990년대에는 의복의 재료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옷감이 유행을 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으며, 상의의 목둘레에 덧붙이는 '칼라[옷깃]'에 모양이 들어가거나, 바지의 경우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치마의 경우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등의 평상복을 즐겨 입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의복이 다양하게 생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지역적인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현대의 의복은 계층과 세대를 넘어서 유행에 따라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갖추어 입을 뿐 지역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란 어렵다. 함안의 평상복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과 별 차이가 없다.
- 『한민족 역사 문화 도감』-의생활(국립 민속 박물관, 2005)
- 『함안 군지』(함안 군지 편찬 위원회, 2013)